- 그날 나는
- 2017/11 제34호
거리에서 전태일 열사와 처음 만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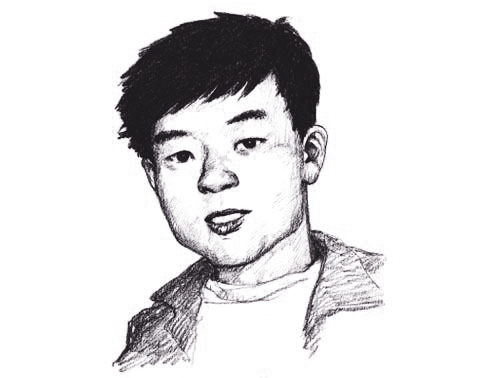
1985년 11월 중순 어느 날. 그날은 수업이 오후에 몰려있었다. 옷을 잔뜩 껴입고 느지막이 학교에 갔다.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학회실로 직행했다. 그즈음 나는 학회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학회실 ‘날적이’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날적이는 과 학생들이 학회실을 오가며 자신의 일상을 적어놓기도 하고, 누구와 언제 만나자며 약속을 잡기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노트 이름이다. 날적이는 지금으로 치면 페이스북, 휴대전화였다. 나는 이유 모를 답답한 마음과 뿌연 안개에 처박고 있는 듯한 머릿속의 생각들을 날적이에 밑도 끝도 없이 적었다. 기억해보면 나의 글에 대해 친구들은 답글보다는(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니 답을 달기 힘들었을 게다) ‘얼굴 좀 보자’라든지 혹은 숙제나 시험날짜를 알려주는 내용을 적었던 것 같다.
그날도 날적이를 보고 있는데 두 학년 선배가 들어오며 “여기 가면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더니 진짜 있네”라며 잠깐 나오라고 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학회건물 뒤쪽으로 나를 데려간 선배는 오늘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날에 맞춰 바깥에서 집회가 있다며 몇 시에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전태일 평전에 대한 기억은 먹먹함·절망적인 슬픔·죄스러움이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아버지의 삶을 풀이해준 책이었고, 대학생이었던 나의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 같은 책이었다.
거리에서 만난 전태일
나와 선배는 중고서점에서 책을 보는 척하며 신호를 기다렸다. 심장은 숨을 쉴 때마다 입으로 튀어 나올 것 같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너무도 느리게 흘렀다.
“어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주동자의 신호가 들리자마자 나와 선배는 차로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모인 200여 명의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청계천 8가 쪽으로 행진했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뛰는 발에 맞춰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구호를 외쳤다. 극도의 긴장으로 첫 구호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중고서점·운동복 가게·모자 가게·신발 가게 등을 지나쳤다.
그러나 집회를 시작한지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대오는 출동한 전투경찰의 체포 작전으로 흩어졌고, 나 또한 시장 안으로 들어가 장을 보러온 척 몸을 숨겼다. 그렇게 나는 열사가 떠났던 그 거리에서 전태일 열사와 만났다.
11월 노동자대회의 탄생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조직적 구심을 만들고, 전국으로 뭉쳤다. 그 이후 11월이면 수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전태일 열사를 만난다. 1988년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첫 전국노동자대회부터 지금까지 거르지 않았으니 올해가 벌써 서른 번째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만남의 장이고, 문화 축제의 장이었으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투쟁과제와 요구를 천명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약속하는 날이기도 했다.
1990년. 아니 1991년이었을까? 내가 공장에 있던 그 해에도 노동자대회가 준비되고 있었다. 대회가 치러지기 한 달 전부터 사업장 조합원들에게 대회를 알리고 교육을 하고, 현장순회를 하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다. 부서의 대의원은 출발하기 전에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대회에 다녀온다고 인사했다. 참가하지 못하는 부서원들은 ‘차비에 보태라’, ‘추운데 따뜻한 오뎅이라도 사먹고 투쟁하라’며 십시일반 모은 돈을 봉투에 담아 내밀었다.
노동자대회가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부서별로 보고대회를 열었다. 참가했던 이들의 감상과 고민을 동료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이렇게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조합원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
내가 바라는 11월 노동자대회
주변의 몇몇 동료들에게 전국노동자대회하면 떠오르는 거나 기억에 남는 노동자대회가 언제였는지 물어봤다.
돌아온 답은 엄청 추웠던 것, 투쟁사업장의 일일주점에서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 술에 취했던 것, 지방대오는 ‘5시 신데렐라’였던 것, 갖가지 유인물 폭탄 세례 등이다. “아니 그해의 주요한 이슈나 요구 같은 것은 생각이 안나?” 하고 다시 물어도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들 말한다.
돌아온 답은 엄청 추웠던 것, 투쟁사업장의 일일주점에서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 술에 취했던 것, 지방대오는 ‘5시 신데렐라’였던 것, 갖가지 유인물 폭탄 세례 등이다. “아니 그해의 주요한 이슈나 요구 같은 것은 생각이 안나?” 하고 다시 물어도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들 말한다.
노동조합 중앙 조직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나도 다를 바 없었다. 노동자대회는 내복과 두툼한 점퍼를 꺼내 입는 날이었고, 무대 설치나 해체 등에 일손 거들며 노가다 하는 날이었으며, 각 지역별로 참석자 확인하고 참석자들의 점심 도시락을 챙기기 위해 대회의 대오 속에 앉아 있지도 못했다. 내가 속한 노조의 사전집회라도 있으면 본대회로 대오가 빠진 뒤 2~3시간씩 쓰레기를 주웠던 기억만이 떠오른다. 속상하고 서글펐다.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주요한 노동이슈를 제기하고 함께 투쟁하는 날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노동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러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쓰윽 제목만 훑어보고 버려지는 유인물 한 장에도 글 내용과 기조를 모아내기 위한 토론·글 쓰는 노동·편집노동·인쇄노동·운반노동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고 배포된다. 그날 대회에 20종 정도의 유인물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결합된 노동과 노동자수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부디 올해 노동자대회는 노동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노동자대회이길 바라본다. 자신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노동자 전태일을 살려내는 대회이길 바란다.
마음을 다잡고 결의를 표현해 왔던 머리띠조차 보기 힘들어진 요즘, 중앙 조직의 조직 방침과 지침에 따른 참석이나 의례적인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전태일 열사가 외친 절박한 노동자 삶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가 주인인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모아내는 광장이 되길 바란다. ●